[박철수의 '거취와 기억'](4) 치솟는 욕망이 버거워..'복덕방 할아버지'는 하나둘 자취를 감췄다
[경향신문] ㆍ주거난민 시대, 집 없는 서민의 경유지 ‘복덕방’

지난 시간은 아련한 향수로 되새김된다. 물론 돌아갈 생각은 누구라도 없다. 그럼에도 그때를 추억한다면 지금의 신산한 삶보다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았을 것이라는 ‘기억의 조작’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지금보다 젊었기에 생각만이라도 사치를 하고 싶어서일지도 모를 일이다. 복덕방에 대한 기억도 그렇다.
“이 골목 안 막다른 집에 순이네 식구가 살고 있었다. 순이 아버지는 집주릅 영감으로 계유생(癸酉生)이라니까 올해 예순일곱이 분명하다. 현재 칠백원 전세로 들어 있는 함석지붕의 일각대문 집, 방 한 칸 마루 한 칸 부엌 한 칸의 매 한 칸 집으로 오기 전에는, 참말이지 남부럽지 않게 살았었노라고, 이것은 영감보다 두 살 위인 그의 마나님이 툭하면 뇌는 소리다. 그것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진솔 두루마기라도 새로 다려 입고서 단정히 갓을 쓰고 거리로 나설 때, 자못 기품과 위엄조차 갖추고 있는 영감의 신수는, 어느 모로 뜯어보든, 가쾌나 그러한 사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단편소설을 잘 쓴다 하여 한국의 모파상으로 불렸다는 월북 작가 이태준의 단편 <골목 안>의 일부다. 1939년에 발표되었으니 80년 가까이 지난 풍경의 묘사지만 몇 대목은 아리송하다. ‘복덕방(福德房)’을 운영하는 순이 아버지는 ‘예순일곱’으로 ‘집주릅’이라는 직업을 가졌는데 제법 차려입고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그를 ‘가쾌(家 )’로 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복덕방 할아버지’로 불렸음직한 어르신의 모습은 그렇다치지만 ‘집주릅’이며 ‘가쾌’라니. 고개를 갸우뚱거릴 말이다. 물론 이들 단어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도 한참 동안이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으니 나이 지긋한 분들은 추억과 시절을 떠올릴 말이다.
■복(福)과 덕(德)을 나누던 복덕방
‘집주릅’이나 ‘가쾌’와 비슷한 말로 ‘객주(客主)’와 ‘거간(居間)’이 있다. 김주영의 대하소설 <객주>에 묘사되었듯이 물건 도매업과 운송업 혹은 창고업을 하는 회사나 개인을 일컫는 말이 ‘객주’이고, 사람들 사이의 상품이나 토지·가옥의 매매·임대·전당(典當), 또는 사채 알선이나 흥정을 하는 일을 ‘거간’이라 불렀으니 오늘날의 중개업과 비슷한 말이다.
그런데 이들의 거래나 알선 품목과는 달리 주로 집(가옥)을 알선하고 흥정하는 이들을 오래전부터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있었으니 그것이 곧 ‘가쾌’인데, 우리말로 ‘집주릅’이다. 조선시대부터 이들 ‘집주릅’들이 모여 가옥중개업을 하며 부르게 된 이름이 ‘복덕방(福德房)’이다.
1929년 9월27일에 발행된 잡지 ‘별건곤’ 제23호에는 복덕방과 관련한 흥미로운 설명이 실려 있다. ‘서울에서는 가옥중개소를 복덕방이라 하고 중개인은 가쾌라 하는데 시골에는 없는 말’이라는 것이다. <경성어록>에 담긴 내용으로만 보자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도회 이외의 지역에서는 ‘복덕방’이란 말이 널리 쓰이지 않았고, 그곳을 통해 가옥을 중개하는 이들을 ‘가쾌’라 불렀다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탄생한 직업이 곧 ‘가쾌’이고 그 일에 종사하는 이들을 일컬어 ‘집주릅’이라 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들이 가옥을 중개하는 근거지가 ‘복덕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거의 30여 년이나 앞선 1900년 11월1일자 황성신문 광고란에 ‘복덕방’이 등장하고 1905년 6월24일 광고에는 ‘가쾌’와 ‘복덕방’이라는 말이 동시에 등장하기도 하니 잡지에 실린 해설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모를 일이다. 1900년 황성신문에 실린 광고 내용은 이렇다.
“○西署東嶺 四十三統三戶 金在連의 草家八借文書를 初八日 遺失하엿스니 某人中에 得하시거든 夜順福德房 洪基元家로 傳하면 厚謝하리다. 金相敏 告白.”
‘西署東嶺(서서동령)’이란 지금의 서울시 세종로 일대를 일컫는 옛 지명이니 풀어 말하면 ‘세종로 43통 3호에 위치한 김재연의 초가집 임대문서를 음력 8일에 분실하였으니 혹시 이 문서를 소지한 사람이 있거든 야순복덕방의 홍원기 집으로 전해주면 후사하겠습니다. 김상민 알림’ 정도일 것이다. 김상민이라는 사람이 초가집 임차문서를 잃어버려 이를 되찾고 싶다는 광고인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광고란에 실린 내용이다. “○美洞福德房 家 趙奎七家 價 貳萬兩 任置票紙을 持來路上 見失하엿슨 則 누구든지 失手票紙 勿論休紙하우. 趙奎七 告白”이라는 광고다. ‘미동복덕방을 운영하는 가쾌 조규칠이 이만냥의 거래 내용이 담긴 임시 계약문서를 길에서 잃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니 누구든 주웠다면 쓸모없는 종이일 뿐입니다. 조규칠 알림’ 정도가 되겠다.
이런 복덕방의 풍경은 1960년대 초까지 계속돼 살 집을 알선하고 중개하는 모습이었다. 1961년에 제정된 ‘소개영업법’에 따라 ‘복덕방’은 관할관청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었고, 서울지역의 택지 및 근교의 토지가 주거래 대상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도시와 근교의 논밭·임야, 단독주택과 공업단지 후보지가 중개며 알선의 대상으로 확장된다. 세상이 바뀌고 규모가 달라졌기 때문인데 복덕방의 풍경도 세태를 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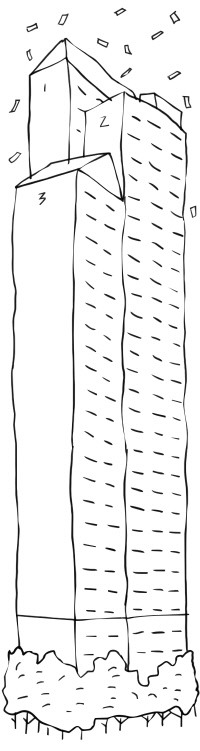
■74호 복덕방과 공인중개사 사무소
서울의 경우, 수도 미화를 위해 새로운 도시계획에 따라 무허가 불량주택이나 천변 판자촌을 철거한 시 당국은 강제 이주민을 위한 주택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 탓에 토목회사에 청부를 맡겨 “적당히 블로크로 간을 막아 가면서 닭장 짓듯이 잇달아 집을 지었는데 방의 골격을 갖춘 것 세 개마다 부엌 형태가 하나씩 달렸고 그것이 엉성하게 하나의 가옥 형태를 이루고 있는” 집단 주택지였다.
“가옥 형태의 안쪽에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어 한 곳에 지은 집이 217채라면 각각의 숫자를 매긴 상점들이 간판을 내걸었는데 ‘74호 복덕방’, ‘193 과부댁 술집’, ‘55상회’ 등으로 이웃사람들을 호명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작가 박태순이 1966년 9월 발표한 <정든 땅 언덕 위>에 나오는 내용이다.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가족을 의탁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나선 가난한 이들에게 도회지 곳곳의 복덕방은 이제 알선과 중개를 통해 이윤을 남기는 발 넓고 수완 좋은 이들의 사업이 되었고, 곳곳의 개발 열기에 편승한 아귀다툼의 현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서글픈 ‘순방의 경유지’가 된 것이다.
1970년 이후 부동산업은 떼돈을 버는 수단이 됐으며, 땅을 샀다 팔았다 하는 일은 대단한 사업으로 변모했다. 서울은 강남 개발을 본격화했고, 사람들은 하룻밤을 자고 일어날 때마다 뛰는 땅값에 혼이 반쯤 나가 얼빠진 표정을 지었고, 어제까지 하던 밭갈이를 그만두고 벽돌공장을 세우거나 복덕방으로 전업을 했다는 작가 최인호의 소설 <미개인> 속 묘사가 당시를 설명한다. 1970년대를 맞아 복덕방 간판은 자연스럽게 ‘○○개발’, ‘○○개발공사’ 등으로 바뀌었다.
달도 차면 기운다고 했던가. 막강한 자금력과 신속한 정보망을 갖춘 주식회사 형태의 복덕방은 1970년대 후반 투기조장, 가격조작, 과다경쟁, 불건전한 거래와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았다. 특히 복덕방이라는 단어에 뿌리를 둔 ‘복부인’과 일반 시민들까지 합세한 투기만연 풍조는 1984년에 이르러 복덕방 영업 규제를 담은 ‘부동산중개업법’ 제정에 이르게 됐다.
부동산중개업법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제와 중개업의 허가제를 동시에 도입한 제도다. 이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이 설립하는 ‘법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허가 관청에서 중개업 허가를 받은 ‘공인중개사’, 결격사유가 없는 복덕방이 기득권을 인정받은 ‘중개업자’ 등 세 종류로 부동산중개업의 자격이 구분됐다. 중개법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중개업자는 허가 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가옥중개만 할 수 있도록 영업 범주가 제한됐다. 이에 따라 ‘복덕방’이라는 명칭이 사라졌고, 비록 중개업자라는 법적 지위와 새로운 호칭을 부여받았지만 개발시대에 자금력과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뒤진 ‘복덕방 할아버지’가 배겨낼 재간은 없었다. ‘복’과 ‘덕’ 대신에 투전판을 방불케 하는 ‘부동산 시장’으로 복덕방의 풍경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다.
■‘떴다방’과 ‘직방’, ‘직칸’
1960년대 초까지 복덕방은 투기를 부추기는 진원지가 아니었다. 집이나 방을 찾는 사람들을 그저 안내하는 역할에만 충실했고, 그런 이유에서 ‘가쾌’나 ‘집주릅’에 머물렀지만 부동산 불패 신화와 함께 불어 닥친 ‘개발 광풍’ 시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었다. ‘복덕방’이라는 말머리에 뿌리를 둔 ‘복부인’이 그렇듯 새로운 형태의 임시복덕방이 생겨났으니 이름하여 ‘떴다방’이다.
돈 주인이 따로 있는 투기자금이거나 일확천금을 꿈꾸는 쌈짓돈을 꼬드겨 미등기 전매를 일삼거나 때론 청약예금(저축) 통장을 중개하는 등의 은밀한 거래를 부추기는 ‘떴다방’은 부동산 경기의 부침에 따라 합법과 불법을 오가면서 집과 돈에 대한 모든 이들의 잠재 욕망에 불을 지폈다. 부동산 불패신화니 강남 불패니 하는 말이 있었듯 집이나 땅이 혹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돈을 몰아주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는 한국사회의 학습된 경험이 쌓인 결과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상하듯 신화는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개발시대는 박물관의 유물이거나 반추하고 싶은 향수가 됐다.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자식세대라는 말이 의미하듯 한국사회의 미래는 어둡고, 고통 만연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양극화는 심화됐고,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하거나 생활비를 채우기 위한 가계부채는 위험수준을 넘고 있다. 기대 감소의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직방’이나 ‘다방’ 등으로 불리는 ‘방 구하기 인터넷 사이트’의 등장은 이를 증명한다. 인터넷망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수단이니 전에 비해 편리하다는 진단은 그 다른 쪽의 슬픔을 감지하지 못한 오진이다. 그 반대편에 우울한 오늘의 자화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 이외수는 아파트를 ‘인간보관용 콘크리트 캐비닛’이라고 설파했다. 그 묘사가 소름끼치더라도 여기서 아파트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집’, 그것이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규모와 삶의 대강이 짐작되고도 남는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대와 희망의 대상이 ‘방’으로 축소됐다. 특히 청년세대에게 ‘집’이란 더 이상 욕망이나 기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저 내 한 몸 의탁할 수 있는 ‘방’이라도 있으면 하는 바람이 보편적 소망이 된 것이다. “사내는 여전히 자신에게 방이 있었으면 한다”는 묘사가 담긴 작가 김애란의 소설 <성탄특선>이 세상이 나온 때가 2006년이니 이미 10년 전의 일이다. ‘직방’이나 ‘다방’을 지나 그저 몸 누일 하늘 아래 한 칸만이라도 얻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직칸’의 시대가 곧 닥칠지도 모른다.

<박철수 |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15분 발언’에 당황한 용산··“처음부터 반칙” “얼마나 할말 많았으면”
- [속보]검찰,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 [단독]방탄소년단 ‘음원사재기’ 사실이었나···재판부 ‘불법마케팅’ 명시
- 김신영 날린 ‘전국노래자랑’ 한달 성적은…남희석의 마이크가 무겁다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갑질 의혹’ 주중 한국대사관, 이번엔 ‘대언론 갑질’…“취재 24시간 전 통보하라” 언론 활
- 국가주석에 국회의장까지 권력 빅4 중 2명 숙청···격랑의 베트남 정치
- 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상위권 문과생들 “교사 안 할래요”
- “고사리 꺾다가…” 제주서 올해 첫 중증혈소판감소증 환자 발생
- [오늘도 툰툰한 하루]한반도 절반이 물에 잠긴다면···롯데타워·강원도가 ‘강자’ 됐다